![[혼저옵서예] 물허벅이 있었기에…](/data/kuk/image/20160625/art_1466381326.jpg)
글·류덕중 대정교회 담임목사
제주도는 물이 귀한 곳이었다. 지금이야 별천지인양 지하에서 마음껏 끌어올려 쓰다 보니 부족함을 모르지만 몇 십 년 전만 해도 용천수가 나오는 해안가가 아니면 물이 없었다. 그래서 빗물마저도 아까워 받아쓰겠다고 만든 것이 촐항아리다. 큰 나무줄기에 풀 꼬아서 묶고 거기에 흐르는 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날마다 비가 오지는 않았기에 중산간지역 사람들이나 용천수가 없는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물을 길어다 사용해야 했다. 제주여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과였다. 그때에 요긴하게 사용하던 것이 바로 ‘물허벅’이다.
대나무나 풀을 엮어 만든 구덕에 출렁거려도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입구를 좁게 만든 물 항아리를 담아서 등에 지고 다녔다. 바람과 돌이 많았기에 머리에 이고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등에 짊어지고서 서서도 물을 옮겨 부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모양을 만들어냈다.
크기가 가장 컸던 ‘바릇허벅’부터 어린 아이가 사용할 수 있었던 ‘애기배대기허벅’까지 종류만도 서른 가지가 넘었다고 한다. 여인들의 아침 첫 일과는 항상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다. 큰 항아리에 한 가득 담아내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때가 있었다. 집안에 큰 잔치가 있을 때다. 제주민들은 그 때에 하나가 됐다. 이웃들이 모두 나서서 자기집 물을 길어오기 전에 먼저 잔칫집에다 길어다 줬다. 일종의 부조(扶助)인 셈인데, 그 물 때문에 큰 잔치도 어려움 없이 치르곤 했다.
부족함을 부족하다 탓하지 않고, 모자람을 모자라다 투정하지 않고, 아예 딛고 넘어서서 생활로 만들어낸 제주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이 새삼 그립다.
지금 이때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모자라나? 하루 세끼 따뜻한 밥에 배부르며 등지고 누울 시원한 방바닥이 내 것인데,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며 모자란다고 소리친다. 이제라도 내 등에 맞는 물허벅 하나 만들어야겠다…. 바릇허벅을 다시 메어야겠다.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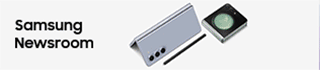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구미시·경산시·영천시·김천시·성주군·고령군 [경북소식]](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4/kuk202405140194.275x150.0.jpg)

![보령 웅천읍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힘쎈충남 브리핑]](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4/kuk202405140251.275x1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