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적게 낳자’ 역사 속으로.“셋째는 의료보험도 안 돼, 그땐 그랬지” 베이비부머 이야기 ②피임 부르는 韓사회.“하나 뿐인 우리 금쪽이” 89년생 지영씨 이야기 ③저출산 韓 집단 XX 사회.“출산율 꼴찌? 나와는 관계없어” Z세대 이야기 |

6·25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부머 시기(1955~1963년생)를 거치며 우리나라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2000년대를 기점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작년 연간 합계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꼴찌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본격화하면서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에 빠졌을까.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들여다보려면 역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출산이 호국(護國)이 돼버린 현재, 세대별 여성의 삶을 통해 오늘날 인구 절벽 위기를 되돌아 보고자 한다.“회사? 결혼해 애까지 있는 여자가 무슨…”
1950년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눈부신 고도 경제성장기를 보냈다. 반면 여성 베이비부머들의 삶은 한국전쟁 전후 희생과 돌봄의 연속으로 고단한 삶을 산 그들의 어머니와 닮은 꼴이었다.
1980년대초 금성사(현 LG전자) 직원이었던 김은숙(가명·60세)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퇴사를 결정했다. 김씨는 “당시엔 여자는 결혼만 해도 회사를 그만두는 게 당연했던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분위기는 당시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졌다. 57년생 이성은(가명)씨는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주변의 주부 10명 중 1명 정도가 회사에 다녔던 것 같다”며 “대부분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부업거리를 받아 살림에 보탰다”고 떠올렸다. 이씨 역시 개당 1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업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한 적도 있었다고.
지금과 달리 아이를 돌봐줄 시설이 많지 않았던 점도 여성이 사회로 나가는 데 발목을 잡았다. 1970~1980년도에도 유치원이 있었지만 5세가 지나야 맡길 수 있었다.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엄마가 가정에서 꼼짝없이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금성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조그마한 공장을 했다”며 “돈은 벌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공장 한켠에 보행기를 묶어 아이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일했었다”고 말했다.
당시의 국가의 가족계획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1960년대에는 “3명의 아이를 3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낳자”는 구호를 외쳤으나 1970년도에는 “셋도 많다”는 분위기로 반전됐다. 19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구호가 바뀌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자녀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 수단이었지만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산업화하면서 이같은 고정 관념이 무너진 셈이다. 정관수술 받으면 예비군 훈련 면제해줬던 것도 이 시절로, 당시 많은 젊은 남성이 국가의 권유에 수술을 받고 훈련을 빠졌다고 한다.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둔 김씨는 “아이가 셋이란 이유로 야만인이란 소리도 들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김씨는 “1993년생인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병원비로 150만원가량을 냈다. 당시 자연분만하면 3만원 내던 시절이었으니 굉장히 큰돈이었다”고 말했다.
다자녀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에도 김씨가 셋째를 출산한 건 아들 때문이었다. 산아제한정책 이후 이른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는 남아선호현상이 두드러졌다. 당시 의사에게 돈을 주며 태아 성별 감별을 부탁하다가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도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임부영(가명·61세) 씨는 “대를 잇겠다며 딸 8명을 낳고도 또 아이를 가진 집도 있었다. 결국 아들 1명을 낳고서야 끝났다”며 “당시 형편이 어려운데 자녀가 많은 집은 (성공)잘 될 것 같은 아이 위주로 투자(교육)를 몰아주곤 했다”고 말했다.
당시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가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다. 미혼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 접어들면 노총각, 노처녀로 여기던 시절이기도 했다. 지금과 비교해 한창 젊은 나이인 20대부터 대부분의 여성은 살림과 육아를, 남성은 바깥일을 담당 한 것이다. 국가에선 이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이 없었다고 여성 베이비부머들은 증언한다. 태권도·미술 학원, 학습지 등 당시에도 사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보단 공부에 대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덜했다던 것 같다고 전했다. 지금은 학원에 가거나 휴대폰, 게임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기 힘들었다. 그 시절엔 놀이할 것이 없어 밖에서 아이들이 해질 때까지 뛰어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유승희(가명·60세) 씨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해질 때까지 안 보여도 큰 걱정을 안했다. 당시 이웃은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었다”며 “요즘은 이웃 간에도 서로 잘 알지 못하고, 뉴스로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접하다보니 우리 때에 비해 아이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여성 베이비부머들은 요즘 육아템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육아용품과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 등을 언급하며 “우리 때보다 정말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순(가명·68세)씨는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쁘다. 입고 다니는 옷도 세련되고 멋있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6·25 한국전쟁 후유증으로 팍팍한 삶을 사는 선배들을 보며 자란 통에 자신을 살필 틈도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서울에서 남편과 금은방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외국 대학에까지 보내 꿈을 이뤘다”면서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요즘 엄마들이 더 멋있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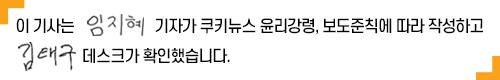





























![김해시, 시민을 중심으로 한 김해시정 펼친다[김해소식]](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5/kuk202404250184.275x150.0.jpg)
![전국 상한가 반열에 오른 '김해 뒷고기'의 진미를 만끽하세요 [김해소식]](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5/kuk202404250192.275x150.0.jpg)
































 포토
포토





![한 지붕 多 가족, 멀티 레이블의 함정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4/kuk202404240205.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