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유일한 도피처인 ‘가정폭력 쉼터’에 가해자가 난입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앞에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해 424개 여성단체의 주최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 측은 “경찰은 가정폭력 쉼터에 침입한 가해자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경찰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A씨가 난입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당시 경찰은 출동 후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가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듯 한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에 따르면, 당시 쉼터에 난입한 A씨에 대한 조치(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경찰은 되려 “저 분이 여기 와서 깽판 쳤습니까”라고 했다는 것.
“쉼터에 입소한 피해여성들은 이곳에서 자녀를 안심시키곤 했다. 그러나 경찰의 방관으로 피해여성과 아이들, 쉼터에 있었던 다른 피해 여성들까지 한밤중에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고미경 상임대표)
그동안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대응의 미비함을 입을 모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국감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공분이 이는 이유다.
허순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면담을 거부하고 쉼터 활동가가 가해자의 격리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고 주거의 평온을 깨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와 만남을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도 “수 년 전에도 ‘부부싸움’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경찰의 직무유기는 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여성의 안전을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피해자들은 살기 위해서 (쉼터로) 나오는 것이다. 피해자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하는가. 피해자가 언제까지 숨어야하는가.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행위를 부끄러워하고, 가정폭력을 반성한다면 쉼터에 찾아올 수 있었겠는가. 왜 그런 가해자를 용인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를 딛고 설 힘을 키우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피난처”라며 “그 쉼터에 가해자가 접근하여 피해자와 자녀를 만날 것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안전한 피난처여야 할 쉼터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가해자의 소란과 협박에 안전을 위협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직접적 보호 아래에 있는 피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쉼터의 안전이 위협 받을 때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쉼터 활동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 온 여성에게 모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형사가 ‘아빠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는 자녀를 데리고 간 행위가 납치로 법에 저촉되며 시설관계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판례를 운운하며 위협했다”고 증언,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경찰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고발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 및 경찰과 관련 책임자 징계, 피해자 및 보호시설에 공식 사과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경찰 인식향상을 위한 경찰교육 계획 수립 ▶가정폭력 현장 초동대응 대책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안전을 위한 대책 즉시 마련 ▶국가의 가정폭력(여성폭력) 정책 및 시스템 전면 보완, 개편 등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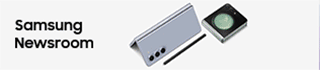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대구·경북, 아침엔 쌀쌀 낮엔 초여름 더위 [오늘날씨]](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3/kuk202405130432.275x150.0.jpg)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쿠키인터뷰]](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8/kuk202405080292.300x17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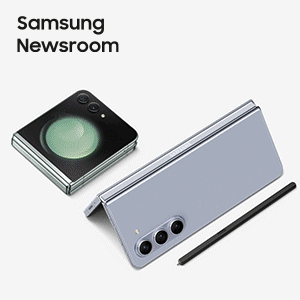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채무자보호법 안착 “조금씩 양보 합시다”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0/kuk202405100133.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