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클럽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등 8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인 QR코드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네이버앱에 이어 카카오톡까지 QR코드 도입에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도 방역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지속되고 있다. 5월경 이태원에 들른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제출받은 데 이어 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탓이다.
◇ 네이버에 이어 카톡까지 QR코드 도입.정부는 내가 어디 갔는지 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네이버앱을 통한 QR코드 제공에 더해 카카오톡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 측에서는 당초 QR코드로 인한 부하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카오페이앱에 QR코드를 넣을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카카오톡에 QR코드를 넣는 편을 선호하여 정부 안에 맞추게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톡에 QR코드를 넣는 방식이 도입되는 건 맞다"라며 "오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방법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아닌 카카오페이를 통한 QR코드 제공을 주장해왔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메신저로 이용자 정보를 넘기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카카오 측에서 부담을 느낀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네이버에서는 이미 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에서 'QR 체크인'을 누르게 돼 있다. 처음 이용할 때와 한 달에 한 번씩은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해야 한다.
현재 8개 업종은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클럽, 실내 입석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권 PC방, 학원 등으로 QR코드식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 도입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QR코드는 휴대폰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주소 등 신상을 바로 알 수 있어 개인정보를 정부가 직접 수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 방문기록을 생성한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정부는 수집한 정보는 4주뒤 폐기되도록 했지만, 그 사이 보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즉 특정한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실명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시설출입실명제’를 실시하는데, 그 법률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옆나라 중국은 코로나 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QR코드를 통해 '감시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쓰촨성, 저장성, 하이난성 등 중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QR코드를 도입했다.
정부는 QR코드를 발급하기 전 온라인 설문조사로 주소와 건강상태, 방문장소, 코로나19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수집한다.
심지어 수집한 개인 정보로 건강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색깔의 QR코드가 발급된다. 초록색은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지만 노란색은 7일간, 빨간색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제한을 뒀다.

◇ 기지국 접속자도 확인."아무리 방역이라지만 너무해"
정부는 앞서 5월 12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자 이태원 클럽 5곳 주변 기지국의 접속자 정보를 넘겨받기도 했다. 기지국 접속자 확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른바 감염병 예방법)'에 들어 있어 가능한 부분이지만,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이 같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감염병 예방법76조2(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확인) 조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법인 및 단체 개인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해두고 있다.
정보제공의 범위는 감염자 등의 인적사항, 진료기록,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등의 사용명세 및 CCTV 내역이 포함된다. 또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도 경찰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이미 이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감염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 환자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정부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당국의 QR코드 도입에 대한 성명을 내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병 역학조사 규정을 갖고 있고, 올해 3월부터 경찰과 통신사, 신용카드사를 연계해 상세 위치정보와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QR코드 도입 등 법이 예정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한다거나 QR코드를 생성한 회사가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해서 보관한다고 해도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의 편의성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개인정보수집의 수단을 사용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제약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강제적인 개인정보수집의 판단을 보건당국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민주적, 법치적 견제장치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보건 당국의 이 같은 접근방식이 코로나19 IT기반의 통제시스템을 효율성, 편의성만을 이유로 일상 각 부문에서 용인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QR코드를 방역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밖에 없다"며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u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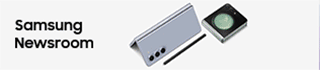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김지철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충남에듀있슈]](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8/kuk202405080103.275x150.0.jpg)









![“목진석만의 바둑으로 감동 드릴 것” [쿠키인터뷰]](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5/kuk202405050031.300x170.0.jpg)
![꿀벌 집단실종, 주범은 ‘사양벌꿀’?…대통령실도 주목했다 [꿀 없는 꿀벌]](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5/kuk202404250396.260x14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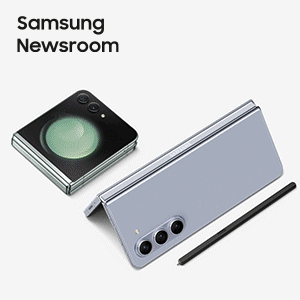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그리고 한국 기업 [데스크 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8/kuk202405080002.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