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과장급 간호사 A씨(30대 후반)가 뇌출혈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날 A씨는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가 응급실을 찾았다.
A씨가 일한 서울아산병원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다. 그중에서도 세 손가락에 꼽히는 ‘빅3 병원’이다. 더 나아가 국내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매출 1위’를 도맡다시피 하는 초대형병원이다. 아산병원의 지난해 의료수익(매출)은 2조5947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그런 큰 병원 안에서 일하다 쓰러진 A씨는 17km 넘게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동료직원인 B씨는 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도 어이가 없지만, 뇌출혈 환자를 응급실에 입원한 지 12시간 만에 전원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현재 병원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병원 측 “할 수 있는 건 다했지만…”
김준엽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에 따르면,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을 시행해 진단 및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뇌출혈 치료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CT에서 출혈을 확인하면 주사제제로 혈압 강하 치료를 한다. 이때 뇌압 강하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이런 것들을 한 후) 꼭 필요한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출혈 골든타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증상 생기면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 이러한 처치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이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한 의료진은 고인이 신경외과중환자실(NSICU)로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처치는 전부 다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응급 치료를 위한 색전술 등 다양한 의학적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통하지 않았고, 특수한 수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왜 뇌출혈 환자를 ‘12시간 만에’ ‘17km 떨어진 병원으로’ 보냈나
그럼 서울아산병원은 왜 고인이 된 응급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을까. 김준엽 교수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포함한 뇌졸중 환자 진료가 가능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언제 누가 오더라도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뇌졸중 환자 진료 지침을 갖추고 있다. 하물며 서울아산병원이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고인에게 할 수술은 워낙 세부적인 수술이라 당직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었다. 이 가운데 하필 그날 수술을 할 수 있는 세부전문의가 휴가를 쓰고 지방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렇더라도 물음표가 남는다. 서울아산병원처럼 큰 병원에서 세부전문의 1명이 휴가를 갔다고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 의문에는 김태정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신경과 교수(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가 대신 답했다.
그는 “간호사를 살리지 못한 걸 외부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부족한 뇌졸중 치료 인프라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의사들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학회를 꼭 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그 때 빈자리를 커버할 동료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뇌출혈 환자를 전원하기까지 12시간이 걸렸다는 동료직원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단과 처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긴 했다”면서도, 실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원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직원이 회복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시스템을 재점검해 직원과 환자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신승헌 박선혜 기자
ss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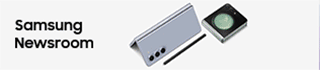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속보] ‘크라운 송’이 해냈다…무박 2일 바둑리그 간다](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8/kuk202405080389.275x150.0.jpg)



![[포토]남성현 산림청장, 충북 진천 산사태 복구지역 현장점검](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8/kuk202405080373.275x150.0.jpg)







![“목진석만의 바둑으로 감동 드릴 것” [쿠키인터뷰]](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5/kuk202405050031.300x170.0.jpg)
![꿀벌 집단실종, 주범은 ‘사양벌꿀’?…대통령실도 주목했다 [꿀 없는 꿀벌]](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5/kuk202404250396.260x14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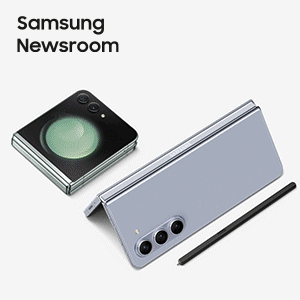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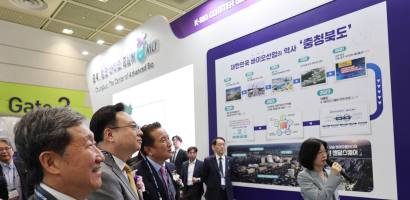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그리고 한국 기업 [데스크 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8/kuk202405080002.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