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찌 왔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경상도 영주 산골에서 석청을 따서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소년으로 이름은 김정한이라 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지? 그가 허름한 보자기를 주섬주섬 펴는데 작은 단지가 나왔다. 자기가 딴 석청이라며, 작은 성의로 받아달라고 했다.
나는 입은 벌어지는데 말이 안 나왔다. 고맙다는 말도 못 했다. 얼마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는 돌아갔다. 그 뒤에도 그는 때가 되면 명절 안부며, 카드를 보내 주었다.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문득 김정한 군이 찾아왔다. 이제는 키도 다 큰 헌헌장부였다.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다.
“선생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요.”
“아니, 어디 중동에 취업이 됐나?”
“그게 아니구요. …제가 몹쓸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무슨 병인데?”
“결핵성 늑막염인데, 중증인데다가 입원할 형편도 못 돼서요. …그냥 죽기 전에 선생님이나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이 착한 사람에게 어찌 그리 무서운 병이. .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나는 무작정 그의 손을 잡고 우리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찾아갔다. 그의 이름은 진춘조 박사였다. 나는 그분에게 소화기 내과 치료를 몇 번 받은 적이 있고, 천주교 교수 모임에서 눈인사를 하는 정도였지 염치없이 찾아갈 만큼 자별한 사이도 아니었다.
나는 여러 말 하지 않고 내가 치료비를 도와주어야 할 어려운 청년인데 도와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진 박사는 대단치도 않은 일인 듯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과 과장에게는 1년에 몇 명 그렇게 무료 진료를 할 특혜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러니저러니 말도 없이 환자를 병상에 눕히고 200cc가 넘어 보이는 주사기로 물을 빼는데, 한 대야가 넘어 보였다. 환자도 밭은 숨을 멈췄다.
진 박사는 약값을 도와 줄 형편은 못되지만 3개월마다 무료 진료로 처방전을 써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나는 다시 우리 서울 행당성당 청년친목회의 약사 조주행 선생을 찾아가 약값은 내 앞으로 달고 원가로 3개월마다 약 좀 지어달라고 했더니 그도 선선히 원가로 도와주었다.
김정한 군은 3개월마다 정확히 약을 먹고 1년 뒤에 완치되었다. 그 뒤 그는 사법 시험을 준비했지만, 법은 알겠는데 답안지 작성을 하기에는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며 응시를 포기하고, 그때 공부한 지식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며 생활을 이어 갔다.
돌아보니 45년 전 이야기다. 이제 불행히도 약사 조주행 선생도 세상을 떠났고, 김정한 군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상을 떠나며, 나에게 보답을 못 하고 먼저 가는 것이 죄송하다고 유족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진춘조 교수는 그 뒤 정년 퇴직을 하고 어느 대형 병원의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들었다. 진 교수가 떠날 때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도 전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걸려 있다.
내가 무슨 보답을 받으려고 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내가 최후의 심판 날에 하느님 앞에 서면 조금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 않으려나?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simon@konkuk.ac.kr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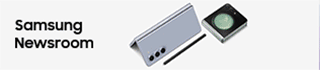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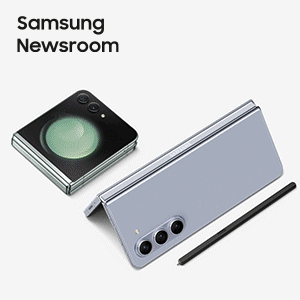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반외팔목’…존폐 기로 선 바둑리그에 ‘훈수’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20/kuk202405200402.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