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금융그룹 3사(BNK·JB·DGB)의 상반기 실적이 모두 발표됐다. BNK금융의 경우 실적이 내려갔으며, JB·DGB금융은 소폭 성장하는데 그쳤다. 그간 순이자마진(NIM)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점차 NIM이 하락하면서 ‘저성장’ 구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금융그룹들은 각자 하반기 전략을 꺼내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DGB·JB 지방금융 3사의 상반기 지배주주지분 기준 연결 순이익은 1조961억원으로 전년동기(1조1106억원) 대비 1.3% 감소했다. DGB금융과 JB금융은 실적이 소폭 성장한 반면 BNK금융이 홀로 8%대 역신장세를 기록하며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
BNK 역성장, JB·DGB ‘소폭 성장’…NIM 감소·비은행 계열사 실적↓
먼저 BNK금융그룹을 보면 상반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은 전년동기(5051억원) 대비 8.8%(449억원) 감소한 4602억원을 거뒀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 등 은행 부문에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은행부문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275억원으로 전년 동기 4046억원보다 229억원(5.7%) 늘었다.
비은행부문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1648억원) 대비 39%(642억원) 감소한 100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BNK투자증권의 실적 감소 폭이 가장 컸다. BNK투증은 지난해 상반기 4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올해는 288억원(-60.5%) 감소한 188억원으로 집계됐다.
BNK캐피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0.0% 감소한 7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BNK저축은행도 지난해 상반기 66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올 상반기 8억원의 적자로 전환했다. BNK자산운용이 집합투자증권 및 전환사채평가이익 증가로 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DGB금융그룹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5% 성장한 30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견조한 원화대출 성장과 함께 비이자 실적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504억원을 기록했다.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 역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했다. 특히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PF 관련 수익이 크게 감소했고, 이와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상품운용 등 기타 부문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반기 누적(연결기준) 29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JB금융지주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3261억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DGB금융을 제치고 지방금융 2위에 올라서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그룹 계열사들의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 전북은행은 1025억원, 광주은행은 141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JB우리캐피탈은 1018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JB자산운용은 67억원, JB인베스트먼트는 3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인 141억원의 실적을 시현했다.
DGB ‘시중은행 전환’, JB ‘핀테크 협업’…타개책 모색하는 지방금융
이처럼 지방금융그룹들의 실적 부진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가운데, 각 지방금융들은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들어갔다.
먼저 DGB금융그룹은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선제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가장 먼저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시중은행과 달리 기업대출 의무비율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 대출 비중이 62%에 달한다. 반면 시중은행은 대출금 중 가계자금 비중이 50%에 가깝다.
또한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할 경우 지방은행보다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이자마진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시중은행으로 바뀌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충청·강원 지역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 전환으로 가계부문 대출 확대 전략을 위해선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과제로 남아있다. 대구은행의 2분기 연체율은 0.50%,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58%로, 전분기 대비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평균인 0.26%, 0.23%의 두 배 수준이다.
JB금융의 경우 핀테크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고 있다. JB금융은 대환대출 분야 업계 3위인 핀다와 상호 지분 교환을 하기로 결정했다. 핀다와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어 디지털 채널로 영업 기반을 확장하겠단 복안이다.
이는 플랫폼 채널 경쟁력을 강화해 금융상품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미 JB금융은 그룹을 넘어 계열 은행들도 핀테크와의 협업으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핀다의 경우 BaaS형태로 카카오·토스와 다르게 금융 라이선스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분석이다.
광주은행은 올해 토스뱅크와 공동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스뱅크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면, 광주은행과 공동으로 대출 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핀다와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서민금융지원 상품 또한 함께 출시한 바 있을 만큼 핀다와의 협업을 지속한 바 있다.
BNK금융의 경우 다른 지방금융처럼 ‘특별한’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2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 당장 인수합병(M&A)나 신사업 진출을 추진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BNK금융 관계자는 “기존 그룹 차원에서 세웠던 중장기 전략인 ‘그로우 2023’(Grow 2023) 최근 종료됐기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이다”라며 “새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미래 성장 전략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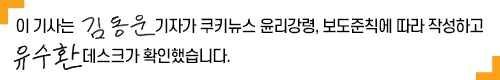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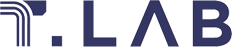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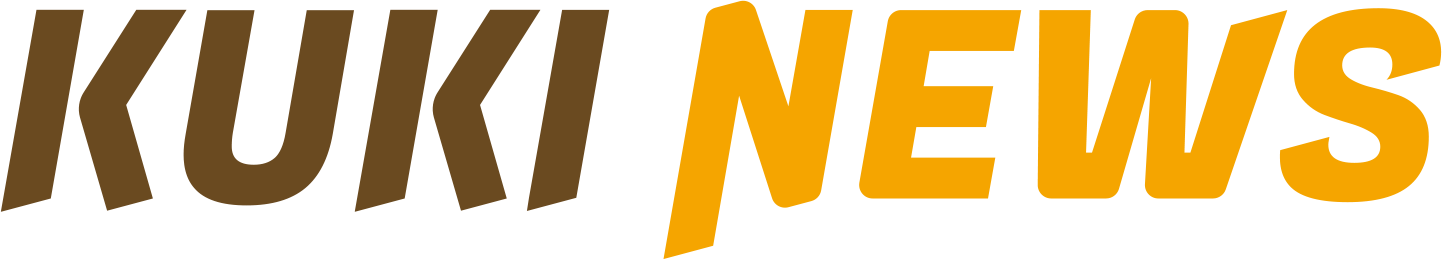
























 포토
포토





![지진 강타...학교 등 시설물 정말 안전할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12/kuk202406120303.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