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도 채권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일 기업의 신용이벤트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 한다. 건설채 만기차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 역시 시장 전체 불안을 불러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AA-’인 기업의 회사채(무보증·3년물) 금리는 3.88%에서 1월 3일 4.017%까지 상승한 후 4일 3.969%로 다시 하락했다. 신용등급 A+ 회사채(무보증·3년물)도 4.563%에서 4.695%까지 올랐다가 4.646%로 떨어졌다. A0와 A- 등급의 회사채 역시 상승세를 보이다 4일 반전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 롯데건설 4350억원, SK에코플랜트 4480억원, HL D&I 한라 2270억원, 현대건설 2200억원, DL이앤씨 2000억원 등 건설채 만기도래 물량이 2조3999억원에 달해 건설채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채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먼저 12월 28일 기준 태영건설이 발행한 단기자금은 160억원, 원화채권 28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익스포저로 넓혀보면 직접여신 5400억원, PF사업장(29개) 4조300억원으로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에 그친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실 우려로 태영건설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 이벤트가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의 단기자금과 원화채권이) 시장을 위축시키기엔 미미한 규모”라고 봤다.
안소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외에도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부실과 위니아 회생절차 신청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고, 변동성도 제한적이었다”며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개별 기업의 신용이벤트는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건설채 만기도래 물량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사 채권금액은 총 3조400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만기도래금액인 69조원의 4.9%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신청이슈가 전반적인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최근 개선된 글로벌 자본시장의 여건에 있다”며 “지난해말 연준 피봇 기대감에 편승한 글로벌금리의 급락세 및 신용스프레드의 동반강세 현상은 웬만한 신용이벤트가 오더라도 집어삼킬 듯 한 기세”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의 발 빠른 대응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리 마련 해놓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채·CP 매입, P-CBO 등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업의 도미노 위기로 이어지면 채권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태영 사태로 비우량 채권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상만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큰 틀에서 시장전체를 교란한 만한 이벤트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결론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위등급의 채권발행사들 입장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단 등급 측면에서 상하위등급간 차별화는 이전에 비해 심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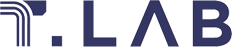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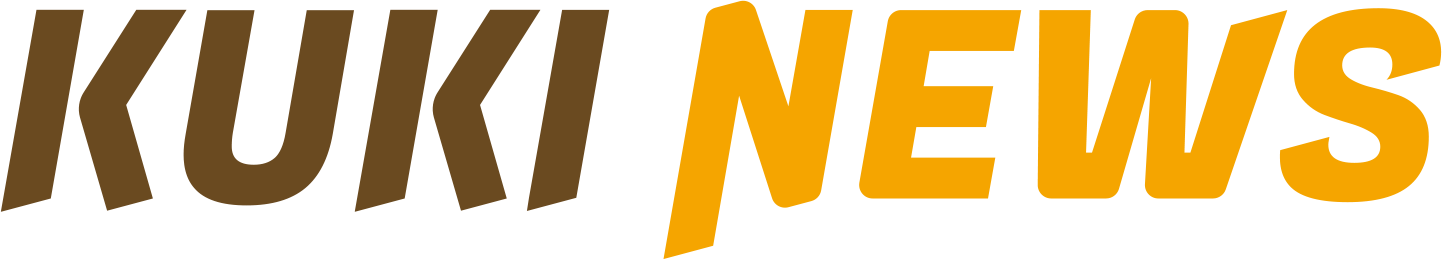

![‘지지율 최저치’ 尹대통령, 부정평가 70% 돌파 [갤럽]](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31/kuk202405310097.275x150.0.png)





![공차코리아, ‘포도 크림치즈폼’ 2종 출시 外 투썸·SPC·더본코리아·프레시지 [유통단신]](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31/kuk202405310091.275x150.0.jpg)
![GS25, 아동 실종 방지 캠페인 전개 外 당근·컬리·NS홈쇼핑 [유통단신]](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31/kuk202405310071.275x15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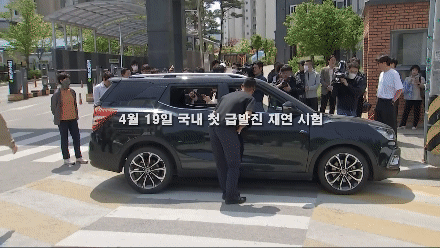











 포토
포토


![민주당,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 “실천하는 개혁국회” [쿡 정치포토]](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30/kuk202405300151.410x200.0.jpg)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이유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30/kuk202405300001.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