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러한 시기는 두 번 있었는데 20대 후반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와 40대 초반 미국 유학 시절이다.
나는 생래적으로 시험을 싫어한다. 그러니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내가 제일 못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대학 졸업 무렵 남들은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나는 일찌감치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7급 공무원 시험은 쉬운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공부할 과목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아 만만치 않았다. 꼬박 2년을 고시원에 들어가 공부한 후에야 간신이 붙었다. 남들은 고시 공부할 때 7급 시험 준비하는 것이 가끔 처량할 때도 있었지만 시험 잘 보는 재주가 없으니 어쩌랴.
그 당시 서울에서 가까운 남양주시 천마산 기슭에 고시원들이 많았다. 산속 여기저기에 조그만 방들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세끼 밥을 해줬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사람 만날 일 없이 내 방에서 온종일 혼자 지냈다. 한창 혈기 방장하던 시절에 산속에서 홀로 지내려니 외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이 조용해서 그동안 복잡했던 머릿속을 정리하기 좋았다.

그 당시 내가 자주 외우던 주문 같은 것이 있었다.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간다.” “또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간다.” “또. 또. 또.” 이 주문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고 고시원에 머무는 동안 자주 외웠다.
고시 출신들이 득세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7급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람 대접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시 출신자들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게 된다. 그런데 그 질서라는 것이 순전히 자기들 편하여지려고 만든 것이라 거기에 편입된다는 것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고시 출신들은 처음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사무관’이라는 호칭을 갖는다. 그런데 그 당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호칭이 없었다(지금은 ‘주무관’ 등의 호칭이 생겼다). 그러니 나를 ‘미스터 임’ ‘임형’ ‘임 선생님’ 등으로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다. 호칭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왜 자기들만 호칭을 갖고 우리에게는 호칭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못 해서? 조직 관리 이론상? 천만에. 나는 사람을 어정쩡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부리기 편하니까. 사람이 공식적인 호칭도 없이 남이 날 어떻게 부를지 신경 써야 하니 얼마나 어정쩡하겠는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명함에 ‘조사관’이라고 써서 다녔다. 조직이 나에게 호칭을 주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정할 수밖에. 다행히 고시원에서 축적된 내공 덕분에 나를 아랫것 취급하는 자들과 싸워가면서 근근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에너지 축적은 40대 초반 미국 유학 시절에 있었다. 나라님 덕분에 팔자에 없던 미국 유학하였다. 내가 가서 본 미국은 한국에서 주변 지인들한테서 들었던 친절하기만 한 사회가 아니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내가 머물던 필라델피아는 특히 인종차별이 심했다. 대학교 교실에서 흑인은 흑인들끼리만 뭉쳐 앉는다는 그것이 상상되나? 내가 자리를 잡으면 옆에 앉아 있던 백인 여학생이 슬그머니 딴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백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학기 중에는 공부하느라 침대에 들어가 잔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날을 책상에 앉아 밤을 새우거나 소파에 앉아 잠깐 눈 붙이는 것으로 잠을 대신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당신 3주째 자지 않고 있다”라면서 쉬라고 했다.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겠는가. 나를 무시하는 백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학교에서 통상 일주일에 15쪽 내외의 페이퍼를 하나씩 써내라고 요구했다. 영어가 서툰 나에게는 마치 무당의 ‘신들림’과 유사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밤낮없이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실제로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
정신이 각성하여 오로지 페이퍼 쓰는 일에만 집중되고 다른 잡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 심지어는 내가 페이퍼를 한글로 쓰고 있는지 영어로 쓰고 있는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평상시와는 다른 상태에 도달했다. 나는 1주일에 한 번씩 그런 상태에 빠져 페이퍼를 작성했는데 그때 쓴 페이퍼들은 지금 읽어봐도 도저히 내가 쓴 것 같지 않다.
정신을 집중하면 내 능력 이상의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2년을 보내면서 내 안에 무언가 축적되는 것을 느꼈다.
그때 축적된 에너지는 40~50대에 내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밑거름이 됐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몇 년 더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목수 일을 배웠다. 책상에 앉아 끄적거리는 것은 그동안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싶었다.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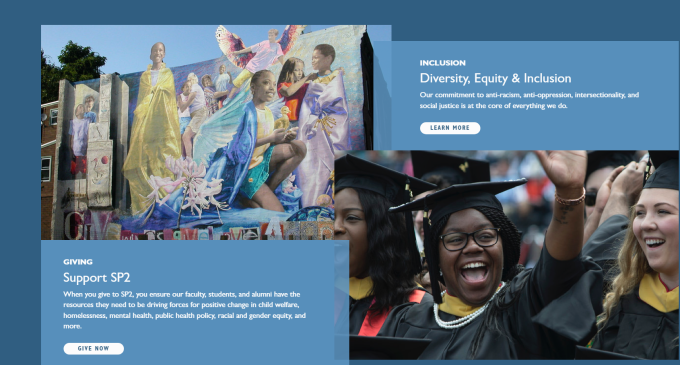
그런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긴 나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 남이 나를 어찌 이해하겠는가.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조직 내에서 밀려서 그만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시쳇말로 한창 잘나가던 시절이었다.
내가 느끼기에 아내 이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은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셨다. 사표를 내니 그가 나를 위원장실로 불렀다. “그만두고 뭘 하려고?” “목수하려고요.” “목수?” “예.” . (긴 침묵 후) “목수 한다니 못 말리겠다. 가서 열심히 해라.”
지금은 세 번째 내공 축적 시기인 것 같다. 시골에 내려 온 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동안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심심해서 수다를 떨려고 해도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저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 가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심심하다고 느끼지만 한 편으로는 이런 단순한 생활에 점점 익숙해진다.
앞으로도 지금 하는 일(고구마나 나물을 가공하는 일)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조신하게 지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뭔가가 축적될 테고, 머리를 어디에다 두고 가야 할지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임송
중앙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펜(Upenn)대학 대학원에서 사회정책학을 공부했다. 1989~2008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부이사관으로 퇴직 후 일용직 목수를 거쳐 2010년 지리산(전북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으로 귀농해 농사를 짓다가 최근 동네에 농산물 가공회사 '웰빙팜'을 설립했다.
jirisanproduce@daum.net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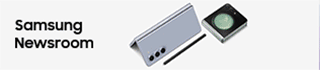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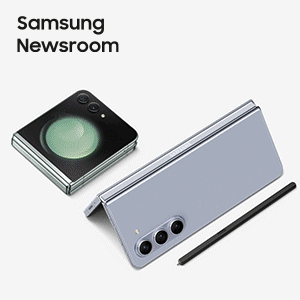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선제적 관리 필요한 젊은 만성질환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5/kuk20240515010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