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없이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정부도 공범” [실종, 멈춘 시계③]](/data/kuk/image/2024/05/22/kuk202405220320.680x.9.jpg)
# 엄마를 잃어버려서 경찰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들은 저를 보육시설로 데려다줬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을 잃어버렸대요. 제 이름은 김민수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박민수라고 불러요. 전 곧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게 된대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과거 한국에서 실종된 아동 일부는 비틀린 사회의 희생양이 됐다. 어떤 아이는 정부 보조금을 노린 누군가에 의해 보육시설에 보내졌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외로 입양됐다. 해외로 입양된 실종 아동의 일부는 성장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한다.
“정부가 공범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실종된 아이들의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야 해요. 아이들 이름을 바꿔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니까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무연고 처리를 해 놨으면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지난 14일 만난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경찰의 초동 수사, 보육시설로의 이동, 해외로의 입양 등 전체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표의 외동딸 희영이는 1994년 4월 실종됐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그 당시엔 실종 관련 예방 교육조차 없었어요. 경찰 초동 수사나 대처도 미흡했죠. 아이들이 실종돼서 신고하면 현장에 경찰들이 나가보질 않아요. 3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수사를 합니다. 3일 전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시나요?”
당시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사흘을 기다리는 것이 매뉴얼이었다고 한다. ‘경찰이 늑장을 부리지만 않았더라면, 가출인으로 접수되지 않았더라면.’ 죄책감, 황망함, 원망은 한데 휘몰아치며 시종일관 부모들을 괴롭힌다.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아동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예방, 홍보, 가족 지원 등이었다. 우리 아이를 찾고자 만든 법이다. 그러나 ‘실종 아동 찾기’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 정부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경찰 전담 수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각 지방청에 장기실종 전담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수사 관할이 형사기동대로 바뀌었다. 장기실종 전담 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오랜 이별 끝에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랜 시간 수사해야 하는 장기 미제 사건 업무의 경우 다른 업무가 많을 경우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서 대표는 이렇게 조언한다.
“부모와 경찰들이 공조해야 합니다. 장기실종 아동 부모들도 경찰 못지않게 수사 능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시스템과 부모들의 노하우가 병행돼야 합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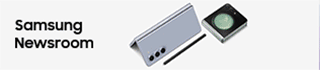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내일 전국 더위 ‘30도’ 넘는다 [날씨]](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15/kuk202406150062.275x150.0.jpg)



![[화보]사진으로 본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이모저모](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15/kuk202406150048.275x150.0.jpg)







![“다 같은 수술 아냐”…재료·방식 따라 다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쿠키인터뷰]](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13/kuk202406130286.300x17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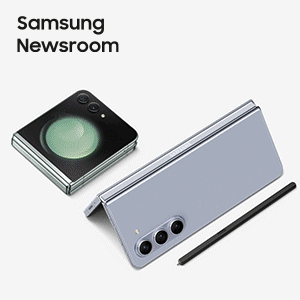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지진 강타...학교 등 시설물 정말 안전할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6/12/kuk202406120303.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