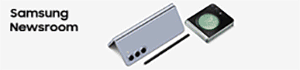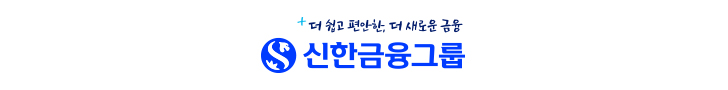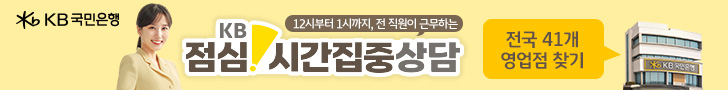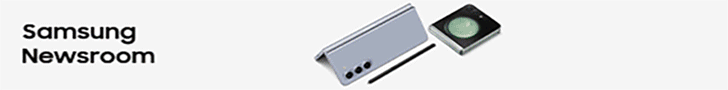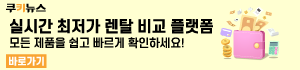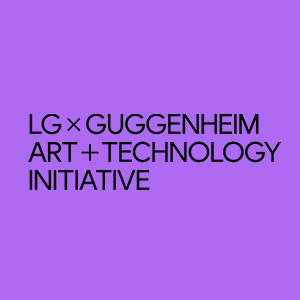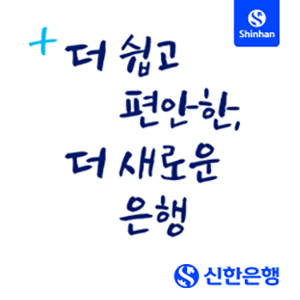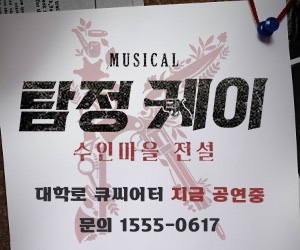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쿠키 정치] 북한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호칭을 부여함에 따라 ‘원수’ 계급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대원수를 정점으로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이 장군 계급 서열을 이룬다. 한국 군제와는 달리 북한군에는 원수가 공화국 원수와 인민군 원수 둘로 나뉘어 진다. 공화국 원수는 사실상 국가원수인 격이다.
이번 ‘진급’ 이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 원수는 이을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뿐이었다. 김 제1위원장이 추가되면서 현존하는 북한의 원수는 2명이 됐다. 김 제1위원장은 북한에서 원수 이상의 칭호를 얻은 6번째 인물이다. 김일성 국가주석이 1992년 대원수(大元帥)에 추대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후에 대원수로 추대됐다.
북한군 계급은 소장이 큰 별 1개로 시작해 별 넷을 다는 대장까지 진급에 따라 한 개씩 별이 추가된다. 원수 바로 밑인 차수부터는 왕별을 달게 된다. 대장 위에 자리 잡은 원수에게 별 5개를 부여하는 서방 세계와는 다른 모습이다. 차수 계급장은 왕별 안에 북한의 국가 휘장이 들어있는 형태이고, 원수는 왕별 위에 휘장이 그려있는 형태이다. 대원수는 원수 계급장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별의 크기가 좀 더 크고 별 주위를 북한의 나라꽃인 목단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인민군 원수는 왕별 밑에 반원 형태의 목단 문양이 둘러쳐있지만 차수는 왕별 뿐이라는 게 다른 점이다.
반면 한국군은 창설 이후 아직까지 원수 계급을 받은 군인이 없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원수는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元首이다. 군대 계급이며 ‘으뜸가는 장수’를 뜻하는 원수(元帥)와는 다른 의미이다.
한국의 군인사법은 군대 계급으로 원수를 정해놓고 있다. 군인사법 3조는 장교의 구분을 규정하며 장관(將官) 즉, 장성급을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특하게도 원수는 정년을 종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7조2항은 원수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군 이래 원수 계급장을 생산한 적이 없었지만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 5개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시에만 5성 장군 계급을 부여한다. 육군은 ‘General of the Army’, 해군은 ‘Fleet admiral’, 공군은 ‘General of the Air Force’ 라는 칭호로 불린다.
흔히 병력 100만명 이상의 통수 권한을 가졌을 때 원수 계급을 붙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정해진 규정은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