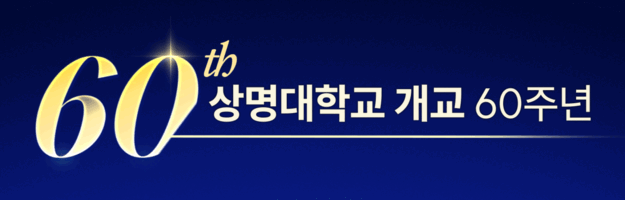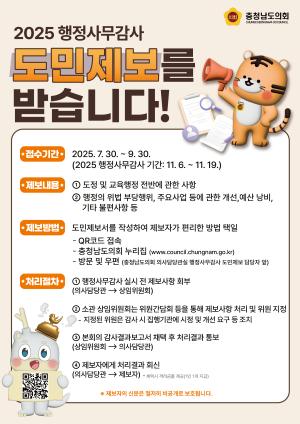1888년 6월 12일에서 20일까지, 프랑스 남부 도시 아를에서 빈센트는 또 다른 연작에 몰두한다. 앞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큰 반향을 일으킨 밀밭 풍경이다. 뜨거운 태양과 찌는 듯한 더위와 비바람도 빈센트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애초부터 날씨 따위가 문제가 되진 않았고, 거리가 멀다고 몸을 사릴 빈센트도 아니었다. 허름한 밀집 모자와 파리에서 산 중고 가죽 구두를 신고 그는 들판을 수십 킬로씩 걸어 다니며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그의 작업은 거친 폭풍우가 몰려와 농작물을 모두 다 망쳐버린 뒤에야 겨우 멈추었다. 빈센트는 테오에게 이 그림이 <하얀 과수원>만큼 좋은 작품이 될 것이며, 오히려 <하얀 과수원>보다 더 강렬하고 멋지게 그렸다고 말했다.
빈센트는 네덜란드에서 아를까지 빛을 찾아왔다. 그 여정의 중간 기착지인 파리라는 대도시는 몸도 마음도 움츠려 들게 만들고 몹시 추웠다. 뜨겁게 대지를 달구는 아를의 태양은 음울한 날씨가 일상인 네덜란드에서 온 빈센트를 완전히 매혹시킬 만큼 강렬했다.
그림 앞부분의 노랑과 빨강으로 그려진 이삭부터 오른편 위 몽마르주 수도원과 알피유 산맥까지 수확기의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황금 들녘이 펼쳐진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온통 금빛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빈센트는 ‘불타오르는 자연’을 화폭에 고정시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 마술사이다.
17세기 네덜란드 야코프 루이스달(Jacob van Ruysdael)의 풍경화처럼 높은 지평선을 가진 이 작품은 몽마르주의 평탄한 풍경을 파노라마로 보여준다. 빈센트는 ‘전통적인 금색’과 ‘하늘색’의 조합으로 숭고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이제 땅에 뿌린 한 알의 밀알이 햇볕과 비의 세례를 받아 알곡으로 여물었다.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는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만 남았다.
빈센트는 자신의 작품은 굳이 사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했다. 그래서 900여 점의 유화에 사인을 남긴 건 11점 밖에 되지 않는다. “내 그림에 서명하기 시작했다가 곧 멈춰버렸다. 그런 짓이 너무 어리석어 보였다.” 빈센트는 본성이 매우 겸손했지만, 유독 이 작품에 대해서는 테오에게 세 번이나 편지를 썼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 그림은 다른 모든 그림을 침묵하게 하는 걸작”이라 자평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의 수가 적다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몽티셀리, 도미에, 코로, 도비니, 밀레가 그림을 아주 빨리 그렸다고 해서 그들의 그림이 추한 것도 아니다. 빈센트는 풍경화를 그릴 때 빨리 그린 작품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림의 모양새를 약간 다듬기 위해, 또는 전체적으로 붓질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그림을 다시 손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림의 주요 부분은 단 한 번에 쉬지 않고 그렸고, 다시 손질할 때도 기본 틀을 유지하려고 했다.
게다가 <라 크로 평야의 수확>을 그릴 때처럼 다시 그림을 손질하고 나면, 더 이상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다.
특히 여섯 가지 주요색, 즉 빨강, 파랑, 노랑, 오렌지색, 라일락색, 초록색을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한 정신 노동을 끝내고 녹초가 된 빈센트를 상상하면 지독한 술꾼에다가 정신착란에 빠졌다던 훌륭한 화가 몽티셀리를 떠올리게 된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힘든 노동과 철저한 계산을 병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작업 중에는 혼자 무대에 선 배우처럼 극도로 긴장하게 되고, 단 30분 동안 수만 가지 조합을 해야 할 때도 있게 된다.

빈센트는 값비싼 물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색 조합을 찾기 위해 상자 속의 작은 털실 뭉치를 이용했다. 그는 색들이 서로를 심화 시키거나, 같은 색이지만 다른 색조를 만들어 내는 색 조합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썼다. 이 털실 뭉치에는 수만 가지 조합을 하며 고심한 빈센트의 손때가 묻어 있다.
그런 작업을 마치고 나면 긴장을 풀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술 한 잔 마시거나 독한 담배를 피우면서 멍하니 취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빈센트의 자화상에 파이프와 쌈지가 많이 그려진 이유다.

깊은 성찰과 사유를 보여주는 예언자적인 이 글은 이 작품을 여동생 윌레미나에게 보내며 동봉한 편지다.
아를에서 <라 크로 평야의 수확>을 그리고 난 이듬해인 1989년 7월, 빈센트는 오베르에서 이 <수확하는 사람이 있는 밀밭>을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찾아온 발작으로 작업이 중단되었고, 9월이 되어서야 완성할 수 있었다. 처음 그린 그림은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 있는 두 번째 버전을 다시 그렸다. 다시 그린 이유에 대해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을 정확히 재현하기 보다 오히려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색을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아를에서 9주간 고갱과 공동생활을 할 때, 고갱은 빈센트가 자연을 보고 그리며 너무 빨리 그린다며 충고를 한다.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의 대화에서 빈센트가 가진 자연에 대한 몰입을 엿볼 수 있다.
"왜 늘 자연만 그리나?"고갱이 묻는다.
"세상과 세상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바라볼 게 없으면 당황스러워. 자연에는 바라볼 게 많이 있어.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해.”
"하지만 자네만의 걸 그려야지. 베낄 필요는 없잖아?" 고갱이 타박한다.
"베끼는 게 아냐, 자연의 본질이 아름다움이니까. 난 자연을 보면 하나로 묶는 가슴으로 떨리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신의 목소리가 들려. 때론 너무 강렬해서 의식을 잃는다니까." 뇌전증을 앓는 빈센트였다.

빈센트는 자신이 열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상태를 억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고 한다. 빠르게 그린 그림이 잇달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둔 덕이었다. “누군가 내 그림이 성의 없이 빨리 그려졌다고 말하면, ‘당신이 내 그림을 성의 없이 급하게 본 탓이라고 말해!”
촌철살인(寸鐵殺人), 정곡을 콕 찌르는 빈센트의 말이다.
빈센트는 <라 크로의 수확>을 그리는 동안 밭에서 직접 수확을 하고 있는 농부보다 결코 편하지 않은 생활을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즈음 빈센트는 살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만큼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붙였다. 그에게는 이 때가 가장 만족스러운 시기였다. 힘은 들지만,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래서 그는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이제 나에게 새로운 색채 예술과 데생, 새로운 예술적 삶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지.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아 그림을 말 수가 없구나. 늘 너에게 보낼 그림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구도자 같이 비장한 빈센트다.
최금희 작가는 미술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을 답사하며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미술 사조, 동료 화가, 사랑 등 숨겨진 이야기를 문학, 영화, 역사, 음악을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50플러스센터 등에서 서양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다.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61)](/data/kuk/image/2025/03/24/kuk20250324000049.jpg)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64)](/data/kuk/image/2025/04/14/kuk20250414000034.jpg)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63)](/data/kuk/image/2025/04/07/kuk202504070000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