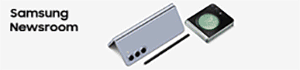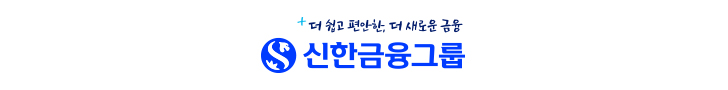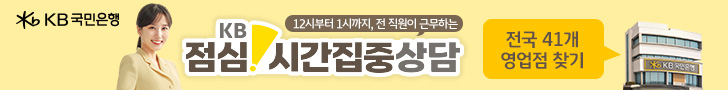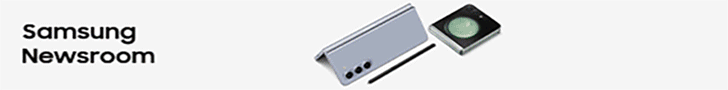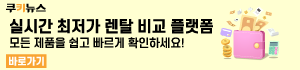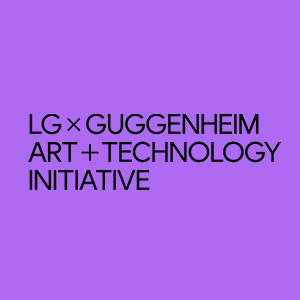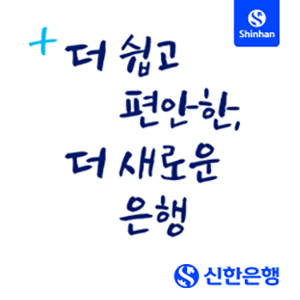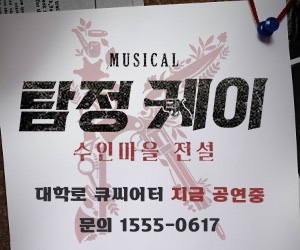며칠 전부터 민주당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지난 8개월간 당력의 90% 이상을 쏟아부은 미디어법 저지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대표나 이강래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일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는 말이다.
실제 최근 상황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책임론에 철저했던 당이다. 일만 터지면 지도부를 갈아치워 3년 8개월간 무려 11명의 의장이 들어섰다.
덕분에 정 대표도 당시 당 의장을 두 차례 지냈는데, 2005년 10·26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문희상 의장이 재임 7개월만에 물러났을 때와 2007년 1월 김근태 의장이 당·청 갈등의 책임을 지고 6개월만에 사퇴했을 때 각각 비상대책위 의장을 맡았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28일 출범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책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위원회의 핵심 직책을 최고위원들이 맡기로 했다. 비상대책위 성격의 위원회를 현 지도부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내에서는 우선 “채찍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 많다. 노영민 대변인은 27일 “소수야당이 무도한 정부 여당에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며 “누구를 탓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80여석으로 8개월을 버텼낸 것은 오히려 격려해줄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계파 의식이 무뎌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전까지만 해도 정동영계(DY), 김근태계(GT), 또 친노계 등으로 분파주의가 뚜렷해 당 의장직을 쟁취하려는 싸움이 치열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원들의 숫자 자체가 줄어 계파싸움을 벌일 형편이 안된다는 분석이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미디어법 강행처리 국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정 대표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비록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지만 민심 역풍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역량을 끌어올릴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반면 정 대표가 이렇다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